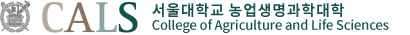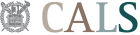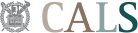- Home
- CALS소식
- 농생대 이야기
농생대 이야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판, 농가 경영지원제도
지난 4월 기획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 인력구조의 고령화 문제와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한 바 있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하려면 초기 정착 지원 외에도 경영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농업 경영의 위험을 완화하고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농가 경영지원제도’를 살펴보려 한다.
농업은 자연재해, 시장 가격의 불확실성,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외생 변수에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특히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과 식량안보 확보의 관점에서도, 정부의 농가 경영 안정 장치는 농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가 경영지원제도에는 크게 휴경제, 생산통제 정책, 가격지지정책, 직접 지불제가 있다. 각각의 제도는 농가가 직면한 경영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에 따른 효과와 한계도 존재한다.
- 휴경제(Fallowing)
휴경제는 일정 기간 농지를 쉬게 하거나 경작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농지의 생산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환경적으로는 토양 피로를 완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휴경은 농가의 생산 의욕을 저해할 수 있고, 일시적인 소득 지원이 구조적인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된다.
- 생산통제 정책(Production Control)
생산통제 정책은 작물 재배 면적을 제한하거나 일정 작물의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급 균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는 시장 내 공급 과잉을 방지하여 가격 급락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정 작물에 대한 과잉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기여한다. 다만 생산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단기적으로는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정 과정에서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 가격지지정책(Price Support)
가격지지정책은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도나 수매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데 효과적이나, 시장 왜곡과 과잉 생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장 가격 수준과 개입 시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
직접 지불제는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농가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WTO에서도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비왜곡적 정책(green box)'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쌀 변동직불제, 공익형 직불제 등이 운영 중이다. 직접 지불제는 생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덜 미치고, 환경보전이나 농촌 유지와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크고,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농가 경영지원제도는 단기적인 소득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농업 구조조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후위기, 고물가, 식량안보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오늘날에는 경영 안정 정책의 다층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농가 경영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